2004년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대신 교단 선택…
휴대전화·승용차도 없이 사택·연구실 오가며 생활
입력 : 2007.01.27 00:23 / 수정 : 2007.01.27 07:21
-
“…그래요?”
‘석궁 테러’에 대해 인터넷에서 옹호 여론이 있다는 말에 노학자는 말문을 잇지 못했다. 부산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조무제(趙武濟·66) 석좌교수. 1993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 때 25평 아파트 한 채와 부인 명의 예금 1075만원 등 6434만원을 신고, 재산 공개 대상 법관 103명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던 사람이다. 대법관 퇴임 때도 재산은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해 2억여 원이었다. 그는 2004년 8월 17일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로펌행(行)이나 변호사 개업을 마다하고 모교인 동아대학교 교수직을 택했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수십억 원을 번 사람들이 인구에 회자되는 현실이다.
그후 2년 반. 조무제 교수는 모교에서 민사소송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법학자로 조용히 살고 있다. 그는 몇 번의 고사(固辭) 끝에 지난 25일 기자를 만났고, 연구실에서 만났을 때에도 “더 할 이야기가 없으니 지면 낭비 하지 마시라”고 했다. “의미 있는 말씀이 있으면 받아 적겠다”고 거듭 부탁한 끝에 차 한 잔과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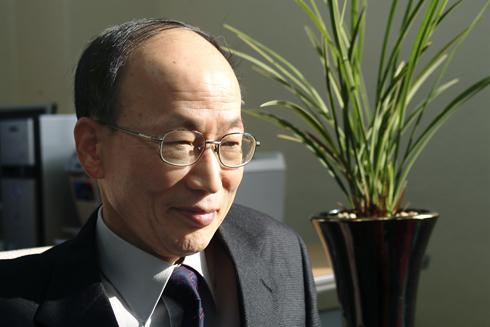
- 부산 동아대 법대 조무제 석좌교수. 2004년 대법관 퇴임 후 로펌행(行)이나 변호사 개업을 마다하고 모교 교단을 택했다. 그는“법관은 고독함 속에서 사색을 하며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부산=박종인기자
-
그는 석궁 테러로 상징되는 사법부의 권위 붕괴에 대해 ‘말없음표’로 대답했다. 테러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인터넷에 확산된 테러 옹호론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오로지 판결로만 말하던 그였다. 옛 부산고등법원 청사였던 동아대 법과대학 6층 연구실에 침묵이 흘렀다.
알 듯 모를 듯 붉어졌던 얼굴빛이 되돌아올 무렵, 그에게 물었다. “대법관 퇴임사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퇴임사 한 구절은 이러했다. “…재판의 외적 상황에 구애돼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여건이 있다고 해서 적정·공평·신속이라는 재판의 이상을 실현할 성스러운 책무를 면할 길은 없습니다….” 퇴임사는 이렇게 이어졌다. “법관은 고독함이 따르지만 그 고독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달갑지 않은 어둠 같지만 고독에 익숙해지면 미처 볼 수 없던 은밀한 사물의 존재까지 알아보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침묵을 깼다. “법관이 하는 판단에는 사색이 필요합니다. 사색은 외로움에서 나옵니다. 소송 관계자나 대인관계에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승소와 패소 양쪽 입장에서 깊이 사색하면 정당한 결과에 가깝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배 법관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는 고독 속에 살고 있다. 교직원들은 조 교수의 자택이 어딘지 알지 못했다. 자택에서 학교 사택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아무도 집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했다. 휴대전화가 없어서 연락도 어렵다. 승용차도 없다. 하지만 법과대 행정실 직원은 “출퇴근 시간은 정확해 굳이 연락이 필요 없다”고 했다. 오전 9시만 되면 산기슭에 있는 사택에서 걸어서 연구실로 나오고, 수업시간이 되면 학생이 있든 없든 꼭 강의실로 나간다.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걸어가 식사를 하고 다시 학교로 나온다. 가끔 직원들과 식사를 하지만 “남이 사주는 식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교직원은 말했다. 오후 4~5시 무렵이면 행정실에서 우편물을 챙겨 걸어서 퇴근한다. 외부 특강을 하면 강사비는 봉투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나줘 준다.
현직 시절 그는 재판수당을 털어 직원들 식사비로 내놓았다. 근무시 외부인은 철저히 출입금지였다. 창원지법 원장 퇴임 때엔 직원들이 고집스레 내놓은 전별금 500만원으로 책을 사서 도서관에 기증했다. 대법관 시절 그는 보증금 2000만원짜리 원룸 오피스텔에서 자취생활을 했다. 배정된 5급 비서관을 마다하고 혼자 업무를 처리했다. “나랏돈을 허비할 수 없다”고 했다. 자기에게 가혹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 한 직원은 “공직에 이런 사람이 몇 분만 더 있어도 세상이 확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에게 물었다. “청빈(淸貧)이 무엇입니까.” 한참 말이 없다. “청빈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법관에겐 재판을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지, 그 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청빈이라… 기준이 있긴 있는 건지요? 오히려 제 약점을 건드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민망하고 쑥스럽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조 교수는 ‘법조인의 윤리’라는 과목을 맡아 강의를 하게 된다. 법대 신입생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좌다. “역시 고독과 외로움을 강조하실 것인지?” “…” 기자를 반듯이 바라보다가 그가 대답했다. “…어렵겠지만, 맞춰야지요.” “어렵다”고 했다. 평생 고독에 친숙했던 법조인이, 바로 그 고독과 외로움이 힘들다고 했다.
'▒ 새로운소식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선시대 王도 사인이 있었다 (0) | 2007.02.05 |
|---|---|
| 神品’의 서예대가 여초 김응현 별세 (0) | 2007.02.04 |
|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동북아 배치 [중앙일보] (0) | 2007.01.11 |
| 미 스텔스기 1개 대대 4개월간 한국배치 (0) | 2007.01.11 |
| 각국 온실가스 규제 팔짱… 더 열받는 지구 (0) | 2007.01.11 |